소음(騷音)의 색
주 대 창
소음은 일반적으로 심하게 불규칙적인 파장을 가진 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아주 작은 음정(< 16 Hz)들로 이루어진 음복합체가 소음이라는 소음의 수직적 성격에 앞서,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 1821-1894) 이후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음의 느낌은 울리는 물체의 빠르고 주기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유발된다. 소음의 느낌은 비주기적인 움직임에 의하여."1)
일상 생활에서 소음은 대개 목적성을 가지지 않는 음향 현상으로서 청각적인 느낌에 따라 '시끄럽다'라고 분류된다. 음향 현상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석에 상관없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음에게는 일정한 높이가 부여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음의 파장의 진폭, 위상,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또 한 소음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부분 음들이 상호 간에 관련성을 허락하는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음은 음높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통적인 음악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소음적 요소를 악기에서 꾸준히 제거하려던 서양의 악기 발달사가 말해 주듯이 소음은 음악 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소리로서 함께 작용하기 마련이다.
현대 음악의 영역에서 소음은 그러나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음악에서 거부되던 그래서 '새로운' 재료인 소음을 적극적으로 창작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에서의 미래주의에 해당하는 '소음주의'를 표방했던 음악가들(Luigi Russolo 1855-1947, Balilla Pratella 1880-1955 등)에 의해 1910년대에 소음이 음악의 영역에 도입되고, 1950년대 이후에 전자 음악에서 소음적 요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작곡 기법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음악의 영역에서 '소음'과 '음'의 용어적인 관계설정의 문제는 그러나 소음의 도입과는 관계없이 무엇보다도 페루치오 부조니(Ferruccio Busoni 1866-1924)와 아르놀드 쇤베르그(Arnold Schönberg 1874-1951)에 의해 음색(Klangfarbe)이 작곡의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두드러진 것이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소음이 아니고 음색이었지만 음악 작품에서 음색의 적극적 변화에 대한 시도는 이후 전통적인 음들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소음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악을 그 태초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음악을 건축 양식적인, 음향적인, 미학적인 독단들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음악을 순수한 창조와 느낌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화성에서, 형식에서 그리고 음색에서 (왜냐하면 창조와 느낌은 선율만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이다.)"2)
"음에는 세 가지 고유한 요소가 알려져 있다: 높이, 색깔, 강약. 음은 지금까지 그가 존재의 발판으로 삼는 세 가지 차원 중에 오직 그 하나한테만 신경을 썼다. 바로 우리가 음높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말이다. 다른 차원들에 의해 음의 현상들을 조직적으로 정비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의 두 번째 차원인 음색의 평가는 화성의 미학적 평가보다 매우 도외시되고 있다. [...] 나는 흔히 거론되는 음색과 음높이에 대한 차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음은 음색을 통하여 두드러지며, 음색의 한 단면이 음높이이기 때문이다. 음색은 그러니까 큰 영역이고, 그 한 부분이 음높이이다. 음높이는 음색과 다를 바가 없다."3)
물리학적으로 음색은 음높이들의 일정한 조합에 의해 그 특징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음향 현상의 특징적인 색깔은 규칙적인 파장을 가진, 즉 중심 높이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음들의 요소를 변화시켜서 뿐만 아니라, 한 소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변화시켜서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의 색깔이 음의 색깔과 용어적으로 구별될만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 경계가 어디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러 개의 불규칙적인 파장들로 구성된 소음도 음색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소음은 직접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높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음들로 이루어진 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언어 표현의 불편함을 내부에 지니고 있다.
이제 음악에서 쓸 수 있는 '악음'(樂音)과 음악에서 거부되던 '소음'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소음이 음악에 쓰인다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음', '소음'이라는 용어가 그 개별적인 의미를 고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음향 현상의 여러 실체를 우리는 음, 소리, 소음 등으로 부른다. 한국어에서 음과 소리는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 순수 한글어인 '소리'를 한자어인 '음'(音)으로 바꾸어 부를 뿐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와 "저 음을 들어보아라!"는 실제에서 의미적으로 거의 구별이 안된다. 단지 한글어인 소리가 좀더 광범위하게 쓰일 뿐이다. 더구나 우리는 한자어인 음을 음악의 영역에만 국한시켜 쓰지 않았다. 그러나 '소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실하게 구별된다: 소음(시끄러운 소리) = 騷(떠들 소) + 音(소리 음). 그렇다면 소음은 단순히 청각 심리학적인 의미로만 이해되는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향 물리학에서는 소음을 음의 높이(주파수)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소음의 파장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파장의 불규칙성에 의한 음높이의 불명확성은 단독음에서가 아니라 복함음에서 거론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기적인 파장을 가진 순수한 음(Sinus)은 기계장치에 의해 생산이 가능하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音) 또는 '소리'라고 부를 때는 배음이 포함된 하나의 복합체로서의 음향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은 악기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어느 정도 소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한 음에서 소음의 요소가 점점 많아져서 그 음의 성격이 소음에 가까울 정도로 모호해지는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개의 음이 함께 섞여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울림의 복합체를 하나의 소음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음들'로 보아야 할지가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지는 것이 파장의 불규칙성의 정도이다. 순간적이고 또 변화가 심한 음들은 청각에 의해서도 소음에 가깝다고 구별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계의 설정이다.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이면 음으로 구별되는 것인지는 앞의 복합체로서의 소음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 나아가 음의 생성 과정에서 이미 불규칙적인 파장이 나올 때 소음의 성격이 굳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완결된 음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날 때 소음으로 여겨지는 것인지도 매우 모호하다. 타악기에서처럼 소음의 생성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 음집합은 소음의 성격을 벗어나기도 하고, 전자음악에서처럼 소음 안에 존재하는 여러 부분음들의 성격이나 비율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도 '시끄럽다'는 소음의 효과가 떨어진다.
한 음의 내부적 요소가 어느 정도 불규칙성과 무관계성을 가져야만 소음이 되는지는 음향 물리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 청각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예로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의 척도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술로서의 음악에서는 청각, 즉 느낌에 의해 사고의 재료들이 일차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음과 소음의 관계가 더 미묘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음과 음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현대 음악에서 무엇보다도 '음색'이 적극적인 작곡의 재료가 되면서이다. 실제적으로 악기 소리들의 특징이나 그 전통적인 결합, 소음에 가까운 비전통적인 음의 생산 및 그 결합, 그리고 새 악기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한 의도적인 소음 요소의 음악적 사용까지를 모두 '음색'이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인 불편함을 무릅쓰고 소음적인 음의 결합이나 그 변화를 '소음에서의' 색깔이라고 표현할 것인지가 풀리지 않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난제는 쇤베르그가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음높이에 의해 설명해야하는 음의 '색깔'이다. '음'의 높이에 의하지 않고는 '색깔'을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색깔'은 음의 높이를 인정할 수 없는 소음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음에도 높이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높이의 변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조절될 수 있느냐에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의 사람들은 '소음의 높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전자음악에서이다. 독일의 전자음악사전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소음의 높이는 음색과 함께 소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소음들은 음악적으로 의미 있게 조절된다."4)
그러나 소음에서의 높이가 전통적인 음체계 또는 이의 변화에 상응하는 신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높이를 표현의 매개로 삼을 수 있다면 소음은 더 이상 소음으로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 이러한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음은 소음의 특성을 가진 것을 표현해야 용어로서의 구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개별적인 지누스 음의 높이는 음악 활동의 실제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실제로 우리는 배음을 가지고 있는 복합체로서의 음에서 '음의 높이'를 따진다. 이러한 복합체로서의 음이 다시 다른 음향 현상들과 결합되어 한 음으로 나타나되 그 일정한 높이를 감지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음'이 되지 않고 '소음'이 될 수 있지만 복합체로서의 그 변화의 양상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 반대로 음향 현상의 실제에서 소음도 어느 정도의 높이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것을 높이로 표현하면 음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역시 색깔로 칭할 수 있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매우 낮은 소음" 또는 "매우 높은 소음"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리지만 - 왜냐하면 높이가 분명하다면 '높은 음' 또는 '낮은 음'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 "매우 어두운 소음" 또는 "매우 밝은 소음"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보수적인 음악가나 음악학자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음악적인', 특히 '정확한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음을 음악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감정적 차원과는 다르게 소음은 그 '색깔'의 변화를 통하여 음악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소음의 색'도 음악용어로 인정된다. 다만 한국어에서 소음(소 + 음)이 서양어에서의 '톤' - '노이즈'(영. tone - noise, 도. Ton - Geräusch) 등과는 달리 음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언어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음색'에 상응하는 '소음색'이라는 간결한 용어가 성립되지 못하고 '색깔' 또는 '빛깔'이라는 단어를 써야하는 불편함이 남는다. 소음 색깔이나 소음 빛깔 대신에 토씨 '의'를 넣어 '소음의 색'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음색과의 상호 관련성은 보장되지만 수식어에 의해 간결성이 떨어지고, '소 음의 색', '소음 의색' 등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소음에서의 색깔은 그러나 '음색'과 관련하여 음악적 의미를 가지므로 본 고찰에서는 '소음의 색'을 제목으로 택했다. 또 '음색'의 '색'에서도 음이 주는 느낌이라는 원래적 의미가 '색깔'로 표현했을 때 더 쉽게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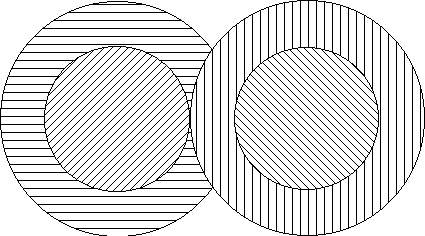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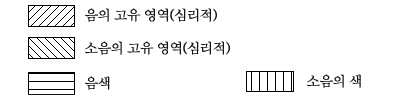
표 1. 색을 통한 음과 소음의 관계설정
1 Hermann von Helmholtz, Die Lehre von den Tonempfindungen als physiologische Grundlage für die Theorie der Musik, Braunschweig 1863, 6. Aufl., 1913, Neudruck, Hildesheim 1968, S. 15f.
2 Ferruccio Busoni, Entwurf einer neuen Ästhetik der Tonkunst, Triest 1907; 2. erw. Ausgabe, Leipzig 1916; Neudruck der 2. Ausgabe, mit Anmerkungen von Arnold Schönberg und einem Nachwort von H. H. Stuckenschmidt, Frankfurt a. M. 1974, S. 58.
3 Arnold Schönberg, Harmonielehre, Wien 1911, S. 470f.; vgl. hierzu das Werk 「Farben」, op. 16. Nr. 3, 1909.
4 Herbert Eimert und Hans Ulrich Humpert, Lexikon der elektronischen Musik, Regensburg 1981, S. 118.

